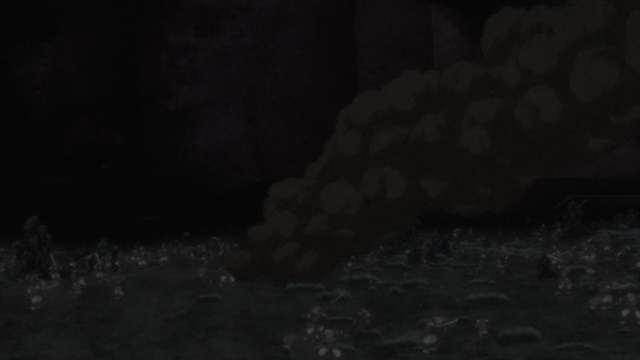'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꿈같은 건 잊어버릴 정도로 평온하길 바라면서’
그래 바랐다.
그런 꿈 따위 한 낱의 악몽에 불가 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따뜻하게 잠이 들었던 것이 분명 했다.
히지카타 씨가 뭐라고 하셨지?
‘너 만은 살아. 여기서 달아나’
곤도 씨는?
‘있는 힘껏 달리세요.’
왜? 어째서?
그러나 물어볼 틈도 없이 내 손을 잡고 이끄는 힘에 달리고 또 달리는 바람에
그 둘의 뒷 모습은 붉은 안개 속으로 차차 멀어져만 같다.
사방으로 튀는 피는 생각했던 붉은색이 아니었다. 오히려 검다고 해야 하나?
옷에 얼굴에 온 몸에 묻히는 피가 누군가의 피 인지도 자각하지 못 한 채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며 몽롱해 질 것 같은 아릿한 묽은 향에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 것 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내가 살던 곳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무참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들은
과연 무슨 이유로? 도대체 왜?
주위를 둘러보면 이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누구의 피 인가 누구의 시체 인가
“거기서”
“!!!”
누군가의 부름과 함께 다리 쪽이 화끈한 고통에 속력을 내던 내 다리는 세게 주저앉아 버렸고
그 틈을 노렸단 듯이 우리를 부르던 그 괴물은 크게 웃으며 들고 있던 긴 칼날을 내리쳤다.
(?)
하지만
다리와 같이 등에 느껴질 그 고통은 어째서 인지 느껴지지 않는다.
눈을 뜨고 천천히 뒤를 바라보면 오히려 그 괴물이 추악하게 입에 피를 뿜으며 쓰러지고 있었다.
짙은 악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