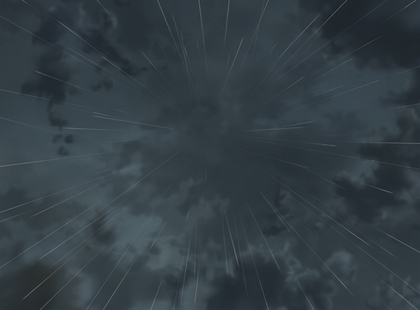모두에게 연락해 카츠라를 데리고 가도록 한 뒤.
긴토키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서
우선 그녀가 걸치고 있던 긴 유카타를 찢어 그녀의 상처를 지혈한 뒤,
자신의 하얀 유카타를 둘러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서
그대로 안아들었다.
"젠장......!!" -긴토키
안돼. 또 다시 이렇게 눈 앞에서 놓칠 수는 없단 말이다.
잡지 못한 손은 절벽에서 떨어져내리던 너의 손만으로 족해.
그렇게 비를 맞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빨리 달리는 그.
왜 아까 우산을 던지고 왔을까. 후회되었다.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다시 그 때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가 떠가기전에 먼저. 망설이지 않고 먼저.
먼저 그녀의 손을 잡았어야했는데.
과거란 돌이킬 수 없기에 제일 무서운 것이다.
"제발, 떠나지마........!!" -긴토키
간절하게 읊조리며 그녀를 안은 손에 힘을 주는 그다.
내 눈 앞에서 떠난 것은 선생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더 이상 그 무엇도 잃고 싶지 않은 건, 너 뿐만이 아니야, (-).
"......냐......"
그렇게 쉬지 않고 빗사이로 뛰는 그의 귓가에, 나지막한 울림이 와닿았다.
그녀에게 닿은 그 손 끝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여린 떨림.
"(-).....?" -긴토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슬픈 표정을 한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모습에, 긴토키는 말을 잃었다.
"그런게......아냐........."
그녀는 그러고서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제서야 보였다. 우는 얼굴이. 진심으로 운다. 눈물흘린다.
그 순간 만큼은 전쟁 때 모든 이들을 두려움에 젖게 만든
흑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한 여자일 뿐이었다.
아니, 친구라는 말이. 더 가까우려나.
"떠나려는게 아냐. 나.......그 날 떨어진 뒤 죽는 줄 알았어....
몸은 안움직이고 숨은 막히고......
그래서 다시는 모두와 만나지 못할까봐....."
"(-).........." -긴토키
그녀는 긴토키를 꽉 붙잡았다.
긴토키는 그런 그녀를 더 세게 안으며 속도를 높였다.
병원에 거의 다다랐을 때 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살았어. 처음에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어.
그 후로 여러 일이 있었고...... 겨우 이곳까지 왔는데......"
막 흐느낀다. 긴토키는 처음보는 그녀의 모습에 적잖게 놀랐다.
그 순간만큼은 질문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다시 허탈하게 짧은 웃음을 뱉었다.
"어쩌다 이리 꼬여버린걸까.....?
난 그저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던 것 뿐인데......"
"..............." -긴토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면서 용케 안 묻네?"
그녀는 상처와 비로 인해 초점이 흐린 눈을 휘어보이며 웃었다.
슬픈 미소. 웃지마. 차라리 그렇게 슬프게 웃을 거라면, 웃지마.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이 한심했는지, 그는 피식 헛웃음을 지었다.
"당연하지." -긴토키
웃지말라는 것은, 잘못된 말이었다.
"네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
언제까지고 기다려줄테니까." -긴토키
"저기, 내가 언제 다시 날뛸 줄 알고
이렇게 도와줘? 후회할지도 모르는데?"
그녀가 조금 비아냥거리며 말하자 긴토키는 혀를 차며 병원의 입구로 들어갔다.
"믿으니까." -긴토키
"뭐............?"
그는 살짝 미소를 띤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믿으니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날 믿으면 돼." -긴토키
슬픈 미소를 지을 바엔, 아예 웃지말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거겠지.
차라리 웃게 하겠다. 그 미소를 기쁨으로 가득채워서, 웃게 하면된다.
내가 너를 믿는 만큼, 너도 나를 믿게 하면된다.
이제서야 왜 그것을 깨달은 걸까. 바보같이.
긴토키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고, 뛰쳐나온 간호사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가는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하고선 눈을 감았다.
"하여간......바보한테는 못....당하겠.....다니깐......."
그녀는 그대로 기력이 다한건지 잠들어버렸다.
더 이상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을 대신 흘려주기라도 하는 듯 하늘의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어느덧 점점 잦아드는 빗소리. 납빛의 하늘이, 점점 밝아져간다.
「처음에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어.」
버려진 것이 아니다. 결국 그 누구도 버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저, 어긋난 손끝의 길이가 너무 멀었던 것 뿐.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렇게 소리없이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비가 그친 뒤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피식 웃는다.
더 이상
우는 날은 없다.
긴토키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서
우선 그녀가 걸치고 있던 긴 유카타를 찢어 그녀의 상처를 지혈한 뒤,
자신의 하얀 유카타를 둘러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서
그대로 안아들었다.
"젠장......!!" -긴토키
안돼. 또 다시 이렇게 눈 앞에서 놓칠 수는 없단 말이다.
잡지 못한 손은 절벽에서 떨어져내리던 너의 손만으로 족해.
그렇게 비를 맞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빨리 달리는 그.
왜 아까 우산을 던지고 왔을까. 후회되었다.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다시 그 때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가 떠가기전에 먼저. 망설이지 않고 먼저.
먼저 그녀의 손을 잡았어야했는데.
과거란 돌이킬 수 없기에 제일 무서운 것이다.
"제발, 떠나지마........!!" -긴토키
간절하게 읊조리며 그녀를 안은 손에 힘을 주는 그다.
내 눈 앞에서 떠난 것은 선생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더 이상 그 무엇도 잃고 싶지 않은 건, 너 뿐만이 아니야, (-).
"......냐......"
그렇게 쉬지 않고 빗사이로 뛰는 그의 귓가에, 나지막한 울림이 와닿았다.
그녀에게 닿은 그 손 끝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여린 떨림.
"(-).....?" -긴토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슬픈 표정을 한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모습에, 긴토키는 말을 잃었다.
"그런게......아냐........."
그녀는 그러고서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제서야 보였다. 우는 얼굴이. 진심으로 운다. 눈물흘린다.
그 순간 만큼은 전쟁 때 모든 이들을 두려움에 젖게 만든
흑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한 여자일 뿐이었다.
아니, 친구라는 말이. 더 가까우려나.
"떠나려는게 아냐. 나.......그 날 떨어진 뒤 죽는 줄 알았어....
몸은 안움직이고 숨은 막히고......
그래서 다시는 모두와 만나지 못할까봐....."
"(-).........." -긴토키
그녀는 긴토키를 꽉 붙잡았다.
긴토키는 그런 그녀를 더 세게 안으며 속도를 높였다.
병원에 거의 다다랐을 때 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살았어. 처음에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어.
그 후로 여러 일이 있었고...... 겨우 이곳까지 왔는데......"
막 흐느낀다. 긴토키는 처음보는 그녀의 모습에 적잖게 놀랐다.
그 순간만큼은 질문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다시 허탈하게 짧은 웃음을 뱉었다.
"어쩌다 이리 꼬여버린걸까.....?
난 그저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던 것 뿐인데......"
"..............." -긴토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면서 용케 안 묻네?"
그녀는 상처와 비로 인해 초점이 흐린 눈을 휘어보이며 웃었다.
슬픈 미소. 웃지마. 차라리 그렇게 슬프게 웃을 거라면, 웃지마.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이 한심했는지, 그는 피식 헛웃음을 지었다.
"당연하지." -긴토키
웃지말라는 것은, 잘못된 말이었다.
"네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
언제까지고 기다려줄테니까." -긴토키
"저기, 내가 언제 다시 날뛸 줄 알고
이렇게 도와줘? 후회할지도 모르는데?"
그녀가 조금 비아냥거리며 말하자 긴토키는 혀를 차며 병원의 입구로 들어갔다.
"믿으니까." -긴토키
"뭐............?"
그는 살짝 미소를 띤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믿으니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날 믿으면 돼." -긴토키
슬픈 미소를 지을 바엔, 아예 웃지말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거겠지.
차라리 웃게 하겠다. 그 미소를 기쁨으로 가득채워서, 웃게 하면된다.
내가 너를 믿는 만큼, 너도 나를 믿게 하면된다.
이제서야 왜 그것을 깨달은 걸까. 바보같이.
긴토키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고, 뛰쳐나온 간호사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가는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하고선 눈을 감았다.
"하여간......바보한테는 못....당하겠.....다니깐......."
그녀는 그대로 기력이 다한건지 잠들어버렸다.
더 이상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을 대신 흘려주기라도 하는 듯 하늘의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어느덧 점점 잦아드는 빗소리. 납빛의 하늘이, 점점 밝아져간다.
「처음에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어.」
버려진 것이 아니다. 결국 그 누구도 버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저, 어긋난 손끝의 길이가 너무 멀었던 것 뿐.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렇게 소리없이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비가 그친 뒤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피식 웃는다.
더 이상
우는 날은 없다.
아아, 무리야.